[발달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엄마의 슬픈 한숨
<발달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1화
칼럼니스트 김유리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에세이 <너와 함께라면>을 쓴 발달장애인 작가이다. 말보다 글이 편하다고 말하는 천생 글쟁이다. 칼럼의 주제에서 '자립'이라 함은 '남에게 의지하거나 매어있지 않고 스스로 섬'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늘려갔던 경험들을 들려줄 계획이다. 그 안에서 발달장애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함께 다루며 장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보기로 했다.
“아휴,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아냐,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더 힘들다고 그러네”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2001년 5월이 가고 6월이 가까워져 올 무렵이었다.
“유리야!”
처음 뵙는 선생님께서 교실 뒷문을 살며시 열고 내 이름을 부르셨다. 2001년 3월, 중학생이 된 지 며칠 지난 날이었다.
낯선 선생님을 따라 낯선 교실로 갔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3월 초순, 바깥날씨는 추웠지만 낯선 교실은 따뜻했다. 낯선 교실 문 앞에 달린 학습도움실이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첫 인상이 푸근하셨던 선생님께서는 내 발 밑에 작은 난로를 가져다 대 주셨다.
그러곤 내게 이메일 계정이 있는지 물어보셨다. 아직 이메일 계정을 만들지 않았고,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나에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다.
이메일 말고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눴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메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일만 기억에 남는다. 얼마 후 나에게도 이메일 계정이 생겼고, 중학교 3년 내내 선생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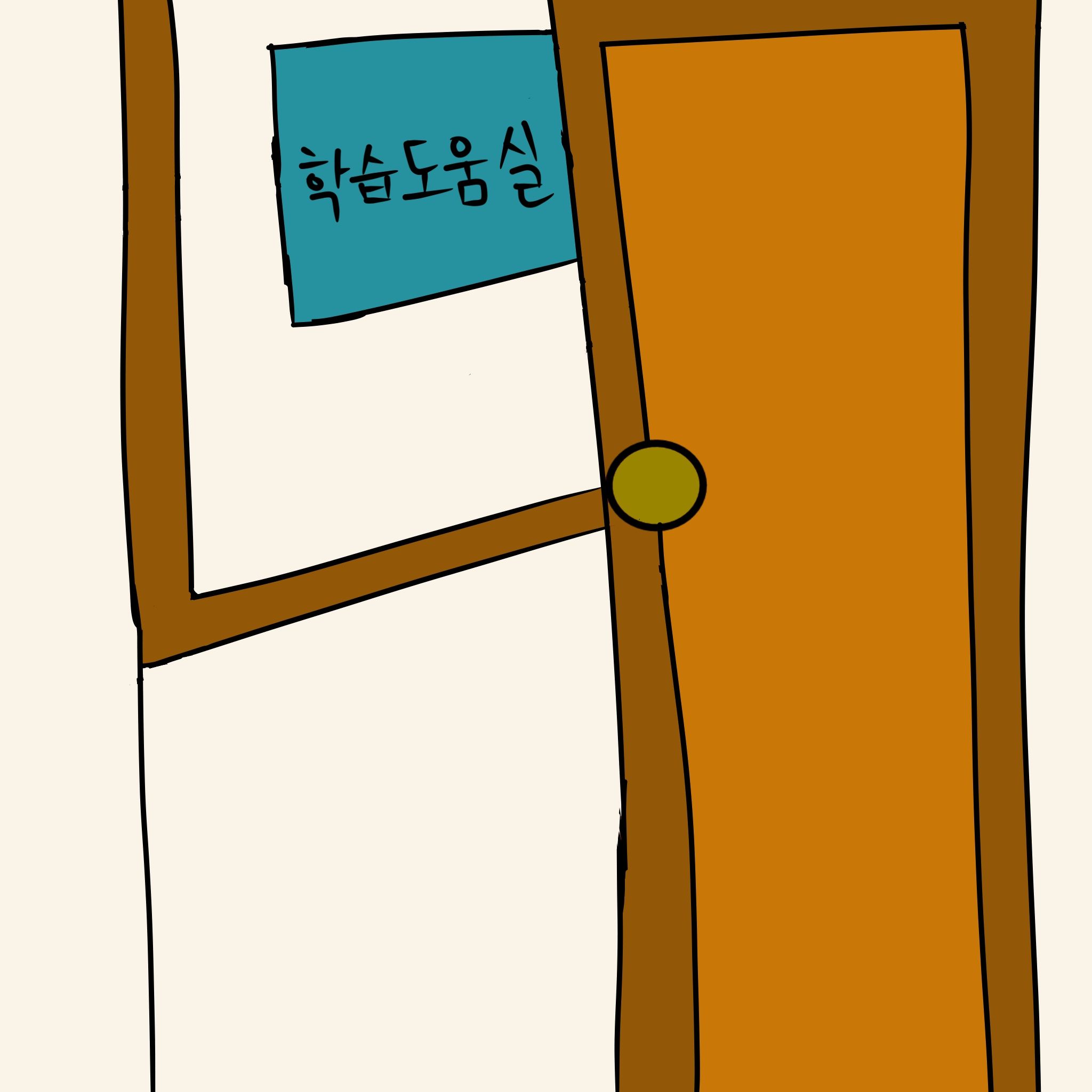
이튿날도 부르시길래 수업을 받다 말고 학습도움실이라는 곳으로 갔다. 이날은 하루 종일 그곳에 있었다. 수업도 안 받고, 선생님 질문에 답하고, 틀린 그림 맞추기를 했다. 종일 다른 교실에 가 있었으니, 부모님이 아시면 혼쭐이 날 것 같았다. 엉뚱한 반에 가서 뭐했냐는 꾸중이 들리는 듯 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해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실직고 했다.
“엄마, 저 오늘 하루 종일 다른 반에 가 있었어요. 어제도 잠깐 갔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죄송해요.”
“엄마도 알아. 엄마가 선생님께 부탁드렸어. 선생님하고 이야기는 잘 했니?”
엄마도 알고 계셨다는 말에 안심이 된 나는 다시는 수업을 빼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순간 다음에는 이메일 계정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는 선생님 말씀이 떠올랐다. 나도 이메일을 가지고 싶었지만 ‘오늘은 뭐 했니?’ ‘오늘 급식에는 어떤 반찬이 나왔니?’와 같이 하루 종일 시덥지 않은 질문만 받는 교실에서 과연 무얼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학과 영어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찍지 않고 풀려고 노력했던, 배움의 의지가 강한 학생이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내 바람과 다르게 또다시 학습도움실로 불러가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엔 내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서류봉투 하나를 주셨다.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다. 서류봉투를 엄마에게 가져다 드리고, 두어 달 후 엄마를 따라서 내가 사는 동네의 종합병원에 갔다.
“아이가 발음이 부정확해요. 중학생인데 얘가 그린 그림을 보면 유치원생이 그린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합니다. 어머님!”
태어나 처음 가본 정신의학과, 묻는 말에 대답 잘하는 멀쩡한 아이를 왜 데려왔냐고 엄마에게 호통 치시는 의사 선생님, 그런 선생님에게 내 상태를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엄마···. 어렴풋하지만 기억이 난다. 학교에서 풀었던 문제를 병원에서도 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는 지치고 슬퍼보였다. 얼마 후 나는 ‘정신지체 3급’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복지카드 하나를 받게 되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의사에게 내 상태를 설명하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길 바랐다는 엄마의 슬픈 한숨을 이해할 만큼 자랐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장애인으로 만들고 싶어 할까?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면,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도 알았다. 엄마는 장애와 비장애 경계선에 있느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으로 살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발달장애라 해서 어른이 되도 어린아이 생각 그대로 멈춰있지 않았다. 나는 1년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씩, 느리지만 꾸준히 자랐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날, 머리가 팍팍 돌아가 ‘71’이란 지능지수가 나왔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능지수 71부터 84까지의 사람을 ‘경계선 지능인’, 혹은 ‘느린학습자’라고 한다고 한다. 하마터면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되었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다.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써 보기도 했다. 글을 쓰기 전에 정보를 많이 찾아봤다.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사회에서 살기 불편해서 지원 좀 해달라는 건데, 겨우 1점 차이로 장애-비장애를 가르며 지원을 해 주니, 못 해주니 하는 국가 행정이 우스웠다.
2015년쯤엔 발달장애 재판정 심사에서 탈락한 주인공 이야기를 상상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써보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5년 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깜짝 놀랐다.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이 아니라니, 내 시나리오 속 주인공은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주인공은 다행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장애등록을 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내 복지카드에는 재판정 시기가 적혀있지 않다.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장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3년 전쯤, 장애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알게 되었다. 훗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당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장애 재심사를 받아오라고 해서 포기했다. 한 달에 3~4만원 받자고 치르는 대가가 너무 컸다.
왜냐하면 나는 장애판정을 받았던 2001년 때 보다 꾸준히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능지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가까운 미래에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살 때, 받았으면 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아니, 차라리 내가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으면 좋겠다. 아쉽지만 장애는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을 때면, ‘내 지적장애가 사라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글을 수정할수록 논리에 맞는 글이 써지기 때문이다. 전문 작가가 아닌 사람들이 쓴 에세이를 인터넷을 통해 읽다보면 ‘내가 글을 못 쓰는 편은 아니구나.’라는 자만심까지 든다. 하지만 모니터 앞을 벗어나면 ‘아~ 내가 장애인이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말과 행동이 느린 건 둘째치고 내 또래의 비장애인들과 인지적인 면과 사회성 면에서 다르다는 게 내 스스로도 느껴지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12화에서 어릴 때부터 또래들보다 느렸던 병희를 특수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눈물에 이런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
“2점 차이예요. 2점만 덜 나왔어도 우리 병희 특수학교에 보낼 수 있었는데···. 나라고 내 자식을 장애 딱지를 붙여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진 :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12화 방송 화면 캡처본
사진 :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12화 방송 화면 캡처본
경계선지능인도 발달장애인과 똑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발달장애인이건, 경계선지능인이건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줬으면 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 장애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은 받는 혜택이 많아서 좋겠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전개지만 언젠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장애 재심사를 받게 되더라도, 부모님의 슬픈 한숨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글, 사진= 김유리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