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부부의 쌍둥이 육아 9화] 응급실 여행기, 순한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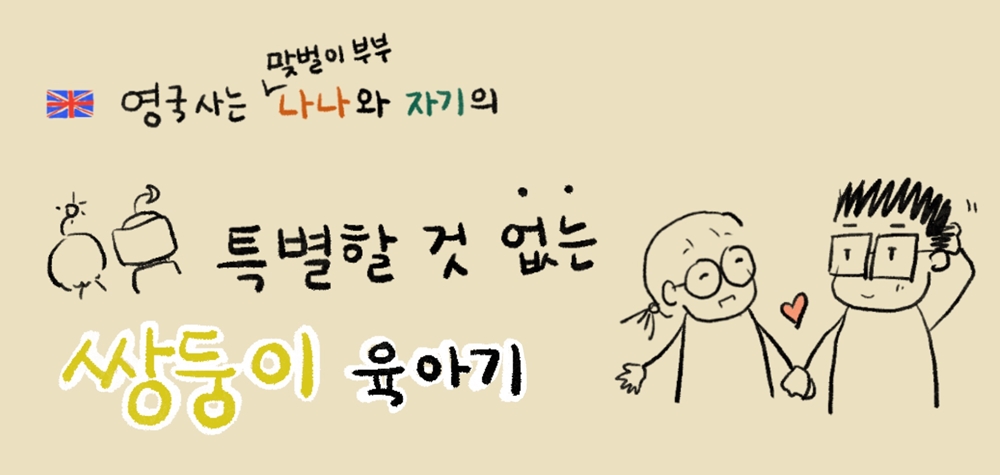
태어난 후 첫 겨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마자 미숙아 쌍둥이답게 해와 달이는 연달아 응급실에 바쁘게 실려갔다.
처음 응급실에 가게 된 건 달이의 요로감염 때문이었다.
혼자 두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달이가 갑자기 몸을 심하게 떨면서 손발이 차가워졌다. 혹시 말로만 듣던 경련인가 싶어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덜덜 떨렸다. 119, 아니999. 그래, 구급차를 부르자.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 소방차를 불러드릴까요?’
‘구, 구급차 불려주세요.. 아이가.. 어린데.. 몸을 심하게 떨어요. 도와주세요..’
‘주소 불러주세요.'
‘네. 여기가...’
‘아이 옆에 있죠?’
‘네..네’
‘아이가 의식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눈은 뜨고 있어요.’
‘호흡 체크할게요, 호흡 할 때마다 숫자 세주세요.’
999에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구급차를 연결해주고, 구급대원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화로 계속 상황을 체크해준다. 아이들이 어리거나,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없는 등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 그렇다. 구급대원들은 오자마자 달이의 상태와 건강기록을 확인했다.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갑니다.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고 초미숙아 출신이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겠어요. 보호자 한 분이 함께 가시겠어요?”
내 전화를 받고 번개처럼 달려온 자기가 달랑달랑 다리를 잡고 놀고 있는 해를 안고, 구급차를 배웅해주었다. 내 인생의 첫 구급차 탑승이었다. 한국에서도 타본 적이 없었던. 달이가 몸을 떤 이유는 단순한 오한이었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경련인지 아닌지 알 방도가 없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신기하게도 달이의 상태가 퍽 나쁘지 않아서 의사의 진료를 보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했다. 그래도 진료를 해주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다. 간호사가 먼저 열과 혈압 등을 재는데 열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해열제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고 나니 의사와 만날 때 즈음, 달이가 방긋 방긋 웃고 있어 조금 민망해졌다. 괜히 유난을 떨어 구급차까지 타고 여기에 온 건가 싶었다.

“열은 좀 내렸네요. 열이 갑자기 나면 오한이 오면서 몸을 심하게 떨 수 있어요. 경련과는 양상이 다르니 걱정하지 마세요. 열이 난 원인을 찾아야 하니까 잠시 좀 볼게요.”
“아이가 어릴 땐 열이 나면 빨리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야해요. 잘하셨어요.”
기본 검사는 무조건 목, 귀, 폐 소리 확인, 그리고 소변 검사다. 다른 검사는 금방 휙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소변 검사. 아기들이 쉬하라고 하면 누는 것도 아니고.. 소변을 조금이라도 볼 때까지 검사컵을 대고 기다려야만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검사 결과 달이는 요로감염, 세균성 감염으로 항생제 진단을 받았다. ‘큰일은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 너무 유난을 떨었다는 약간의 부끄러움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나의 (그리고 달이의) 첫 응급실 여행은 그렇게 끝났다.
다음 타자는 해였다.
찬바람을 타고 모세기관지염이 찾아왔다. 기침, 열, 색색거림, 호흡수 증가… 해는 선천적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이 부족해서 어딘가 한 군데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다. 그래도 바로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동네 GP (1차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급히 진료를 받았는데 (보통은 GP당일 약속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아이들에 한해 응급 약속 시간이 몇 타임 정해져 있다.) 의사가 해의 (어마어마한) 진료 기록을 보고 청진기로 폐 소리를 확인하더니,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라고 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해는 입원을 했다.

영국에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루트는 서너 가지다. 첫 번째는 달이처럼 99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오는 경우, 두 번째는 해처럼 감기인 줄 알고 동네 병원(GP)에 갔다가 응급실로 이전한 경우, 세 번째는 111( NHS 전화 의료 상담) 에 연락하여 상담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의사의 진료가 시급한 경우 응급실로 이전된다. 또는 부모의 판단 하에 응급실로 바로 달려갈 수도 있다. 모든 나라의 응급실이 마찬가지일 테지만, 진료 순서는 접수 순서와 무관하다. 달이처럼 구급차에 실려왔어도 때에 따라 대기를 오래해야 할 수도 있고, 부모가 들쳐 업고 와도 바로 의사를 만나기도 한다.
‘에고.. 응급실을 너무 자주 다니는 거 아니야?’
‘이젠 좀 익숙해지려고 해.. 거기 간호사들도 나 알아 보는 것 같아..;;’
하지만 저런 대화를 나눈 것이 무색할 만큼 응급실은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는 일들이 터지고 말았다.
'응급실 여행기, 매운 맛' 계속...
*글= 나나 작가 (@honey_nana_2)
*그림= 나나 작가, 게티이미지뱅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