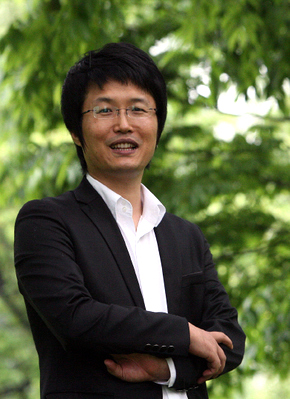[한겨레] 증권가 ‘미다스의 손’ 기부계의 ‘큰손’으로
증권가 ‘미다스의 손’ 기부계의 ‘큰손’으로
[나눔꽃 캠페인] ⑧ 전문직 기부 확산
애널리스트 이종복씨
수익 1% 이상 장애아 지원
출판기금 만든 증권맨 등
고소득자 ‘사회적 책임’ 실천
» 증권 애널리스트 이종복씨. 그에게 기부는 의무이지만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그는 “내가 도우면 사람들이 웃는 게 행복하다. 맛보면 헤어나지 못한다”고 말한다.
나눔단체인 푸르메재단의 최고액 기부자는 10대 재벌그룹의 회장도 브라운관에서 활약하는 연예인도 아니다. 이 재단의 최고액 기부자는 증권방송 <이토마토>에서 투자분석가로 일하는 이종복(39)씨다.
20대 말년 병장 시절, 충북 음성군의 복지시설 꽃동네에서 할머니들의 똥을 치우고 식사를 돕던 게 계기가 돼 한 달에 자동이체로 1000원을 넣은 게 나눔의 시작이었다. 그 뒤 한번도 기부나 자원봉사를 쉬지 않았다. 그는 “기부라는 생각보다 경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4~2005년부터 돈을 ‘벌었다’. 증권사에 일하며 잘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만원 내는 것보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원 내는 게 더 힘들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금액으로 따지지 않고 퍼센트(비율)로 따졌다.
지난해 4월 이씨는 자신을 따르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클럽 복지후원회’를 만들었다. 먼저 “한 달 소득의 1%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뒤, “각자가 수익을 내면 일정 비율을 기부하자”고 제안했다. 5000만원을 넘으면 자신은 더 큰 돈을 내겠다고 부추겼다. 200~300명의 회원들도 호응했다. 추석이 지나자 회원들이 모은 돈이 8300만원을 넘었고, 이씨는 약속을 지켜 자신의 돈 1억5000만원을 푸르메재단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기금으로 내놓았다.
그는 매년 수천만~수억원을 쾌척하지만, 사회적 평판에 따른 비공식적인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니다. 그가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이름을 알려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그는 재벌그룹 회장보다 많은 기부를 한다. 그는 “내가 도우면 사람들이 웃는 게 행복하다. 맛보면 헤어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기부는 의무이고 즐거움이다.
독립 기부자들의 바람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평범하지만 힘은 센 기부계의 큰손들이다. 정태영 푸르메재단 기획팀장은 “그동안 고액기부자들은 기업인이나 연예인 등 사회적 명망가들이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바람이 전문직 등 개인 고소득자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독립 기부자들을 중심으로 기부를 사회적 의무이자 실천으로 여기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증권 전문사이트 팍스넷에서 일하는 최중석(47)씨는 증권으로 ‘돈 번’ 사람들에게 기부 권유를 잊지 않는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최씨는 한 달에 1만~2만원 내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나눔은 “돈을 버는 만큼 비례해 할당되는 것”이다. 최씨는 장애인들을 위한 책을 펴내는 종잣돈으로 ‘최중석 출판기금’에 5500만원을 쾌척했다. 앞으로는 증권과 관련해 가정이 어려워진 이들을 돕는 게 그의 목표다.
아름다운재단이 2007년 기부문화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나눔은 이제 보편적인 사회적 의무로 이행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55%가 기부에 참여했고, 기부자들의 연간 평균 기부금액은 19만9000원에 이르렀다. 왜 기부를 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이들이 ‘사회적 책임감’(26.8%)을 꼽았다. 다음으로 가족문화(24.7%), 동정심(20.8%), 개인적 행복감(15.9%) 차례였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한국의 기부는 여전히 기업 기부에 편중돼 있고, 고소득자의 고액 기부를 유도하는 시스템도 부족하다. 나눔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국 기부금 전액의 70%가 기업에서 나오는 탓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면 기부금액이 줄어든다”며 “개인 기부가 늘고 전문직 등 부자들의 소득액에 맞는 고액 기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부> 끝
글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