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느낀 옷차림과 장애 인식의 상관 관계
<독일은 어때요?> 4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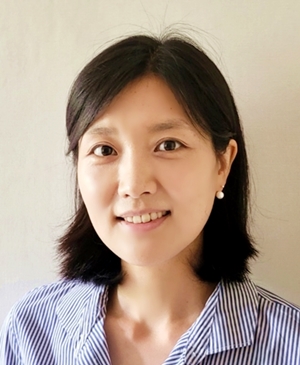
"독일은 어때요?" 칼럼니스트 민세리가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독일에서 16년 넘게 거주하며 특수교육학자, 장애인복지전문가, 통번역가 그리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있다. 이번 연재칼럼에서는 독일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에 대하여 생생한 현지 소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일 사람은 대체로 옷차림에 관심이 없다. 국민 대다수가 청바지와 티셔츠, 운동화 그리고 커다란 백팩을 착용하고 다닌다. 불편함을 감수한 세련됨보다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촌스러움'을 더 추구하는 민족이다. 독일인의 옷차림과 관련해 내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사진 출처: unsplash
지금은 초등학생이 된 아들의 어린이집 시절, 나는 5년간 매일 같이 아이의 등하원을 책임졌다. (독일에는 어린이집 버스가 없어 부모가 직접 등하원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매일 자녀를 등하원시키면서 출퇴근하는 다른 부모들을 만났는데, 희한하게도 대다수 부모의 옷차림이 굉장히 소박한 데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다.
안냐는 봄가을에 매일 똑같은 갈색 스웨이드 코트를 입고 출퇴근했다. 마티아스는 매일 아침 연두색 바람막이 재킷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크리스티나의 겨울 출근룩은 늘 카키색 패딩 점퍼와 검정 스커트 그리고 검정 백팩이었다. 올레는 아침마다 헝클어진 머리에 다소 허름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출근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비네는 한결같이 검은색 운동복 차림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부모들의 직업이다. 안냐는 건축가, 마티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크리스티나는 제약회사 마케팅 팀장, 올레는 대학교수 그리고 사비네는 판사이다. 게다가 이들은 자기 분야에서 잘나가는, 그야말로 돈 잘 버는 엄마 아빠들이다. 하지만 나는 당시 이들의 옷차림만 봐서는 직업과 소득 수준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아니, 나의 모든 예상이 완벽하게 빗나갔다.
당시 이 경험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독일에 살면서 더 이상 상대방의 옷차림과 겉모습을 신경 쓰지 않으니 서서히 상대방의 인성과 개성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025년 봄, 베를린의 어느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민세리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는 독일에서 개인은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표출한다. 동시에 사회는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한다. 나는 독일의 이런 사회 분위기가 그들의 장애 인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 역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남들이 (또는 비장애인이) 무슨 옷을 입든 상관없다. 장애인도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는다. 남들이 (또는 비장애인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장애인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남들이 (또는 비장애인이)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다. 장애인 역시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독일 사회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세련된 옷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으며, 남들이 보기에 멋져 보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사회가 규정한 틀에 박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준비하고 개척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잘 이행되는 국가가 독일이다. 그래서 독일 장애인 삶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독일에도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옷차림과 외모, 그리고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에 비해 독일에는 단순히 외모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독일에서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이런 사회 분위기를 쉽게 경험할 수 있다. 틱장애로 특정 소리나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어도 승객들을 그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정신장애로 시끄럽게 혼잣말을 하거나 출입문 근처를 정신없이 맴도는 사람이 근처에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심지어 순간적으로 숨을 멎게 하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노숙자가 곁에 있어도 승객들은 그 사람을 일부러 피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는다.

벚꽃을 감상하며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하는 베를린 시민들 ©민세리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늦은 오후 나는 산책을 하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페인트 자국으로 범벅이 된 흰색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는 도장공의 모습도, 먼지 가득한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는 공사인부의 모습도 멋져 보였다. 장애인 작업장에서 퇴근하는 발달장애인들의 모습도 아주 멋졌다. 나는 이들의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들의 장애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름다운 벚나무 아래에서 함께 걷는 우리 모두는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조화롭게 빛나는 존재였다.
*글, 사진=민세리 칼럼니스트
